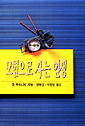회원 로그인
베스트서평
솔직하고 거침없는 슬픔에 대한 일기장
 헤아려 본 슬픔/C.S. 루이스/홍성사/조영민
헤아려 본 슬픔/C.S. 루이스/홍성사/조영민이 책은 조심해서 읽어야 할 책이다.
루이스의 다른 저작을 읽어본적이 없거나 신앙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다면 이 책을 안 읽는게 낫다. 적어도 이 책은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와 ‘예기치 못한 기쁨’ 정도는 읽고 난 후에 읽는게 옳은 책이다.
만약 그 두 권의 책을 읽지 않고 이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은 슬픔에 빠진 어떤 이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수준, 심한 혼란 속에서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저자의 의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저자가 20세기가 나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고 그가 어떻게 신앙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밝힌 ‘예기치 못한 기쁨’과 고통의 실존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들에 대해 고찰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명쾌한 신과 고통과 신앙에 대한 체계에 감탄해 본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단순한 슬픔의 기록 이상의 가치로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다.
모차르트에 대한 전기에서 모차르트가 그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한마도 말도 하지 못하고 곧장 파아노 건반으로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했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었다. 감정에 대해 표현하는 법, 특별히 엄청난 슬픔에 대해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저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감정의 분출구였던 ‘글쓰기’를 택한다.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거의 대부분의 작가는 독자에게 읽혀질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지만 이 글에는 그런 냄새가 없다. 철저하게 일기이다. 저자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어갔고, 그 감정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한 구석에도 독자를 위한 배려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책은 읽기가 어렵다. 이 책은 애당초 책이 아닌 것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집안 곳곳에 굴러다니던 노트에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적게 된, 이 ‘슬픔의 일기’에는 그렇기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지성인의 상징적 존재였던 저자의 이름에 걸맞은 깔끔하고 체계적인 무엇이 아니라 철저하게 솔직한 한 인간(범인)의 ‘슬픔’이 그려져 나오고 있다. 4부로 구성된 (실제로 4권의 노트에 낙서처럼 적혀진) 이 글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그 아내 조이가 죽은 직후부터 꽤 많은 주가 지나서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내용들의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슬픔에 빠진 이들의 범인의 글이 그러하듯 논리적 구성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의 글이지만 그의 글답지 않다.
C.S.루이스를 좋아한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명증함을 좋아한다. 서구에서 나온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 속에 나오는 루이스의 글 속에 나와 있는 글에 대한 인용들을 보며 지적인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걸을 수 있었다. 자신의 영적인 저서전인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조차 저자는 자신의 명쾌한 논리와 글쓰기의 과정을 보여주었고, 쉽게 읽히나 결코 쉬운 책이 아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조차 저자의 탁월성을 경험하며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헤아려 본 슬픔’을 통해서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명쾌한 글을 남겼던 그가,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하는 이의 상실이라는 주제 앞에서 비참할 정도로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에서 그가 그토록 많은 이에게 증명해 오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회의적인 언어들을 남발하는 것을 텅헤사 ‘살아있는’ 루이스의 마음을 접할 수 있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슬플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는 .... 그런 인간 루이스를 만날 수 있었다. 약 두 시간정도 루이스와 함께 슬픔의 바다에 빠져 있었다. 감정적으로 급격하게 찾아오는 통곡이 잦아들고, 차츰 그의 이성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이라는 현실을 점점 더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루이스를 봤다. 자신이 평생을 들여 변증했던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조차 의심하며 하나님을 향해 ‘닫혀버린 문’이라고 1부를 통해서 말하던 루이스가 4부 끝에서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라고 말했던 아내 조이의 목소리를 상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슬픔의 노트’를 마감된다. 이 책만 가지고는 루이스가 그를 혼돈에 빠지게 한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 이 글들이, 비록 가명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기 위한 글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에서 나는 루이스가 이 문제에서 답을 찾았을 것이라 상상한다.
이 책은 모든 슬픔에 대해서, 또는 사별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다. 이 책이 슬픔의 교과서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정말로 용감하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 하나의 숨김도 없이 기록된 글이다. 이 솔직한 용기가, 결국에 이 슬픔 속에서 더한 가치인 사랑을 찾게 해 주었고, 예기치 못한 슬픔을 안겨준 신에게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가게 한 힘이었다.
감춰두고 꼭꼭 숨겨둬야 했었을 루이스의 ‘슬픔의 일기’가 내 손에서 읽혀졌음에 감사하다. 저자의 여러 단면 중 가장 보고 싶었던 부분을 본 것 같았고, 그의 슬픔을 공유하며 그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이론적 단계로서가 아닌 솔직한 한 사람을 통해서 슬픔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마가목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왜 하필이면 그것이 우울하게 보이느냔 말이다. 괘종시계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항상 있었던 어떤 특징이 빠져 나가고 없다. 세상이 이처럼 무미건조하고 남루하고 닳아빠진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일까? ”(59)
- csluis.gif (0B) (12)




203개(7/11페이지)








 신고
신고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